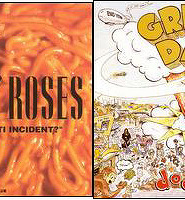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Rexism : 렉시즘
귀환, 장기하와 얼굴들. 본문

영화계만 성수기가 있는게 아니다. 음반계의 전반적인 불황이야 이제 10살째를 바라보는 듯 하지만, 무언가 계시를 받은 듯이 굵직한 타이틀들이 한번에 쏟아지는 시즌이 있기는 있다. 올 6월부터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드는 것은 눈뜨고코베인, 장기하와 얼굴들, 들국화 헌정 앨범, 디어 클라우드 등 괄목할만한 밴드들의 복귀작이 나오는 탓이 크다. 이중 당장에 눈과 귀를 잡아끄는 것은 장기하와 얼굴들 쪽이겠다. 3년전부터였던가. 홍대 클럽씬을 중심으로 ‘물건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고, 흐느적하는 팔의 율동과 콧수염 안경 청년을 중심으로 한 밴드가 온라인과 무대를 달궜다. 외형의 특기할만한 구석으로 그 정도의 주목은 어려웠을 것이다. 첫 앨범의 효시가 된 EP와 데뷔 1집이 보여준 눈에 띄는 판매량이 그들의 입지를 증명하였고, 좀 섣부른 사람들이 ‘루저 마인드’와 ‘88만원 세대’라는 문구를 들며 이들의 음악에 대입하였다.
합당한 일이었을까? 좀더 성급한 사람들은 지금은 고인이 된 음악인 이진원(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과 같은 항목으로 묶으며, 이들의 음악에 드러나는 패배자 정신을 동시에 거론했다. 좋은 분류는 아니었다. 장기하의 음악에서 드러나는 궁상맞음의 의도적 나열과 이진원의 음악에서 드러나는 자기연민의 토로는 의외로 거리감의 폭이 넓은 것이었다. 장기하가 6, 70년대 복고풍 한국대중음악 레퍼런스에 대한 경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반면, 이진원의 음악은 당시 홍대씬의 풍경과 부합하는 현재형에 가까웠다. 같이 묶일 이유가 그렇게 많진 않았다. 장기하의 1집 음악을 흥미롭게 만든 몇몇 가사들, 특히 ‘아무것도 없잖어’나 ‘별일없이 산다’ 등의 내용이 일부 사람들에겐 정치적으로 보이거나 긁어주는 맛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장기하 1집의 내용을 흥미롭게 만든 것은 보컬리스트로서의 장기하의 명확한 발음과 그것의 모델이 된 ‘과거 당대’의 한국대중음악의 몇몇 레퍼런스들이었다. ‘아무것도 없잖어’, ‘별일없이 산다’를 들으며 배철수를 떠올리지 않기란 힘든 일이며, ‘나를 받아주오’는 송창식이, ‘오늘도 무사히’엔 김창완(과 산울림)이 소환된 듯한 기분이었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오마쥬고, 싱겁게 해석하자면 표방이나 인용으로 보이는 요소들이다. 장기하의 구성지면서도 명확한 보컬과 ‘얼굴들’의 연주력이 이 싱겁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영리하게 배치한 덕에 앨범을 나름 알차게 채웠다.
재밌다면 재밌을 수 있는 미미 시스터즈와의 무대 퍼포먼스는 이런 요소들과 합체하여 장기하를 네티즌들의 아이콘으로 격상시켰다. 이때부터 문제는 발생하였는데, 이런 외적인 광경과 앨범의 아슬아슬한 완성도 덕에 몇몇 음악팬들에겐 장기하는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다. 성공한 1집 음악인들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과제, ‘과연 다음엔 이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들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세상엔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표현들이 많다. 가령 소포모어 징크스(Sophomore Jinx)라는 말이 그렇다. 내겐 그 표현이 정확하진 않지만 감상과 감흥의 대상이 되는 음악을 경제학의 논리로 심술궂게 재단하는 표현으로 조인다. 네가 얼마나 더 잘되는지 한번 노려보마 하는 투로 말이다. 장기하의 얼굴들의 무대를 작년 지산락페스티벌에서 본 적이 있다. 어느새부터 그는 더이상 미미 시스터즈를 대동하지 않았다. 당연히 불화는 아니고 ‘전략적’ 해산일 것이다. 난 그게 더 좋아 보였다. 흐물흐물한 팔 댄스 퍼포먼스는 그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보다는 그를 한갓 이슈메이커로 보이게 만드는 장벽 같았다는 생각을 일전부터 해왔다. 그런데 무대는 어땠냐구? 아주 좋았다. 그는 소문대로 발음과 발성이 좋았고, 무엇보다 어느정도 락스타로서의 자의식이 확연히 있어 보였다. 관객들을 쥐었다놨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앨범에서만큼 영리해 보였달까. 그게 꽤나 건강해 보였다.
당시 이미 2집에 들어갈 신곡이라며 ‘TV를 봤네’라는 곡을 들려줬다. 그 곡은 내게 좀 별로였다. 이제 한적한 말투로 다소간 뒤튼 심사를 표현하는 노래들은 안해도 되지 않겠냐 싶었다. 이미 그런 곡들은 1집에 즐비하지 않은가? 그러다 1년이 조금 덜 되 현재 2집이 공개되었다. 이제는 적어도 레퍼런스를 의식적으로 추출한 듯한 모습보다는 장기하와 얼굴들이 완성에 가까운 형태의 밴드가 되었다는 몇가지 근거가 보인다. 일단 건반의 가세가 밴드 사운드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고작(?) 밴드 1명의 의미를 넘어서 키보드포지션 이종민의 가세는 밴드가 재현하려는 복고풍의 분위기를 튼실히 살찌웠다. 하몬드 오르간, 무그 신디사이저 등의 출렁출렁 짜르르한 선율은 이들이 재현하려는 ‘어떤 당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치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객원 멤버이자 프로듀싱을 맡은 하세가와 요헤이의 손맛이 만만찮은 도움이 되었다. 이미 미미 시스터즈의 독집 앨범으로 프로듀서로서의 역량을 과시한 전력답게, 여기서도 제법 수훈감이 되었다. 산울림과 신중현의 음악을 쫓아 한국에 자리잡은 이 일본 출신 음악인은 현재 김창완 밴드의 기타리스트이기도 하다. 미미 시스터즈의 독집에서 그는 크라잉넛, 로다운30, 서울전자음악단, 김창완을 초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미와의 협연을 통해 ‘(락음악으로서의) 한국대중음악사’의 장관을 나열하는 기지를 발휘하였다. ‘과거로서의 당대’에 대한 예우를 표함은 물론, ’지금의 당대’에 놓고 재현하는 이 음악인은 점차 한국대중음악사의 탐색가가 되어가는 듯 하다. 아마도 그의 이름을 더욱 자주 발견하게 될 듯 하다.
2집의 수록곡 중 ‘모질게 말하지 말라며’ 같은 경우는 사실 영락없는 김창완풍 보컬이다. 이런 곡들만 있었다면 2집 역시 1집 같은 의구심이 되었을테다. 하지만 앨범은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마냥 걷는다’와 ’날 보고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같은 막판의 넘버들은 노래 잘 부르는 장기하와 밴드 자신들의 자신감이 총화되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덕분에 1집에 대한 다소간 거리감이 있었던 시선을 부비고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즈막한 피아노로 시작하여 각 파트가 충실하게 구성을 쌓고, 그리고 복잡한 후반부로 치닫는다. 마치 1번 트랙 ‘뭘 그렇게 놀래’의 가사 “이렇게나 멋지게 해낼 줄은 몰랐었어”라는 구절을 증명하듯 말이다. 소포모어 징크스들은 수치에 신경쓰는 사람들에게나 문제일 듯 하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음악을 특정 세대론과 세태에 빚대는 것은 오히려 한정적으로 갇힌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당장에 한 팀의 음악인들이 좋은 밴드로 성장했음을 축하하는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리라.
+ 면도를 하고 안경을 벗은 장기하의 ‘얼굴’을 보고 과거로 돌아가 달라는 웹상의 원성을 보자면, 확실히 이 사람이 가진 스타성이 ‘락커’의 어떤 부분에 가까워진 듯 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다. [110615]
+ 한겨레웹진 HOOK 게재 : http://hook.hani.co.kr/archives/29089
+ 한겨레웹진 HOOK 게재 : http://hook.hani.co.kr/archives/29089
'음악듣고문장나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1년 상반기의 8장 (4) | 2011.06.27 |
|---|---|
| 장기하와 얼굴들 [2집]에 대한 간단한 초록(1차) (0) | 2011.06.14 |
| [가늘고 짧은 취향 편력기.R] 10화 (0) | 2011.05.30 |